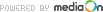광화문으로 출퇴근하던 시절, 나만큼이나 부지런히 그 일대를 오가던 이들이 있었다. 나는 인턴기자였고, 그들은 ‘여사님’의 석방을 외치는 집회 참가자들이었다. 정권 교체 목소리와 애국가 사이로 늘 한 노래가 반복됐다.
“짱X, 북X, 짱X, 북X,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빨리 꺼져라.”
일명 '짱북송'으로 불리는 귀에 박힌 그 구호는 퇴근길에도, 샤워 중에도 머릿속에서 재생됐다. 자극적인 리듬보다 더 선명하게 남은 건, 그 안에서 엉겨진 얼굴들이었다. 공산당과 중국인 관광객, 권위주의와 중국인 유학생, 체제와 개인이 몇 음절 안에 뭉그러졌다.
언어는 세상을 정리하는 힘을 가진다. 현실은 복잡하고, 감정은 쌓이기 쉽다. 그럴 때 하나의 말 혹은 하나의 개념은 문제의 전모를 요약해주는 듯한 착각을 준다. 그것은 플라톤이 말한 이데아의 또 다른 형태일지도 모른다. 이상적 실체가 아니라, 현실 위에 덧씌워진 굳은 관념. 그 틀은 이해를 돕기보다는 판단을 앞세우고 구분을 흐리게 만든다. 지금 한국 사회에 떠오른 ‘혐중’은 그런 이데아에 가깝다.
반중과 혐중은 분명 다르다. 반중은 공산당 체제나 그 정책에 대한 비판이다. 정치적 견해이며, 정당한 저항의 표현이다. 그러나 혐중은 특정 국적 개인에 대한 감정적 배척이다. 낯선 얼굴을 향한 거부감이며 존재 자체에 가하는 적대다. 하지만 이 둘의 경계는 점차 흐려지고 있다. 어느 순간부터 공산당을 비판하는 목소리와 중국인을 향한 분노가 한 문장 안에 함께 등장한다. 감정은 구분을 밀어내고 점차 혐오로 이어진다. 그리고 점차 공적인 목소리를 장악해간다.
대림동, 건대입구 등 중국인 밀집 지역에서 “중국인은 나가라”는 구호가 울려 퍼지고, 거리에서 ‘짱북송’이 응원가처럼 울린다. '시진핑 장기이식으로 150세, 실종자 급증 장기매매 몸조심!', '중국 유학생은 100% 잠재적 간첩', '검찰개혁은 북한의 지령!'과 같은 얼토당토 않은 현수막이 거리에 나부낀다.
반중, 혹은 혐중 시위를 이끄는 일부 우파 청년단체들의 메시지도 강경해지고 있다. 일부 단체는 최근 BBC 인터뷰에서 “중국인 간첩 의혹”을 제기하며, “국가보안법 제정 이후 민주주의가 무너진 홍콩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국 공산당에 반대한다”고 말하지만, 그 언어는 현실의 중국인 유학생과 이웃 주민에게로 쉽게 전이된다.
혐오가 반복될수록, 그 언어는 정치적 태도로 자리 잡는다.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다. 혐오가 하나의 정체성으로, 일종의 세계관으로 굳어지는 것. ‘혐중의 이데아’는 그렇게 만들어진다.
20대와 30대는 기성세대보다 중국에 더 비판적인 시선을 가진다. 권위주의적 체제에 대한 거부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 홍콩 시위나 코로나 사태, 반복되는 역사 논쟁과 문화 표절 논란까지. 감정을 자극할 소재는 충분하다. 부국임을 인정하나, 좋아할 수는 없는 나라. 청년의 분노는 그렇게 단단하고 일관되게 쌓여 있다.
그 분노의 출발은 정당하다. 인권을 탄압하는 권력에 대한 비판, 불투명한 외교 전략에 대한 감시,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감수성. 어느 것도 틀린 태도는 아니다. 그러나 이 정당한 문제의식이 분별 있게 유지되고 있는지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감정이 사람을 향하는 순간, 비판은 혐오로 전이된다. 정치 체제를 향하던 비판이 유학생과 이웃 주민, 관광객에게 옮겨붙는다. “나는 인권의 편에 섰다”는 확신은, 어느 순간 타인을 향한 적대조차 정당화한다. 혐오도 정의의 얼굴을 하고 나타날 수 있다.
팩트는 때로 사실이라는 이름 아래 맥락을 은폐한다. 그러나 어떤 ‘사실’도 배열과 어투, 전달의 방식에 따라 감정의 결을 갖게 된다. 표현의 자유는 허용되지만, 그 표현이 사회에 어떤 파장을 남기는지는 자유 외곽에서 판단돼야 한다.
광화문에서 들은 ‘짱북송’은 결국 경고였는지도 모른다. ‘중국을 싫어한다’는 말이 ‘중국인을 싫어해도 된다’는 태도로 번역되는 사이, 우리는 타인을 향한 언어의 윤리를 잃어버린다. 필요한 것은 혐오의 언어가 아니라 구분의 언어다. 청년의 분노가 혐오를 위한 무기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 세계를 보는 감각으로 남기를 바란다. 혐중의 이데아에서 빠져나오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의 가장 시급한 기술이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공보부국장 김태연(pkloijk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