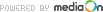[편집자주] 해당 기고문은 필자의 요청에 따라 가명으로 게재됩니다.
아마 다시는 갈 일이 없겠지만, 나는 아직도 가끔 언진재가 자리한 그 정동길을 생각한다. 어떤 종류의 결핍도 느낄 수 없었던,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다고 생각되었던 그 길을. 아마 그건 안도감이 아니었을까. 이 도시의 어엿한 구성원이 되었다는 안전의 감각. 실제로 나는 그즈음 내 삶을 구성해 온 오랜 취미들로부터 거의 손을 뗀 상태였다. 더 이상 음악을 만들지도, 야마 없는 글을 쓰지도 않았다. 오래된 물건과 옷 수집을 그만두었고 요리에 대한 열정 역시 식은 상태였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뤄낸 꿈,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이란 것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언진재 교육이 끝난 우리는 회사로 복귀했다. 의외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 일주일간 못다 한 사내 교육을 끝마친 후 본격적으로 마와리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었다. 복귀한 우리를 본 국장이 군기가 빠졌으니 “빠따”를 한 대씩 쳐야 한다고 말하긴 했지만, 그런 엄포와는 달리 사진 촬영 교육, 기사 헤드 쓰는 법 따위를 교육받으며 다소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한 주가 지나갔다.
사내교육이 한창이자 마와리를 며칠 앞둔 어느 날, 우리를 경악하게 만든 카톡이 날아왔다. 한 기수 위 선배가 보낸 그 카톡에는 우리가 사내에서 지켜야만 하는 예의범절들이 길게 적혀 있었다. 선배에게는 무조건 다나까를 써야 하고, 카톡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마침표로 마무리해야 하며,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하고, 모든 대답은 ‘네’ 뒤 마침표로 통일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였다. 시대착오적인 이 풍습이 아득바득 살아남고 심지어 대물림되어 기어코 나에게까지 도착했다는 사실에 나는 내심(이라기보다 대놓고) 경악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선배가 보낸 카톡에는 며칠 후 예정된 대면식 장소의 주소와 함께, 그에 맞춰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 예의범절 이상으로 빼곡이 써 있었기 때문이다.
대면식은 말 그대로 신입 기수와 선배 기수가 만나 얼굴을 트는 과정을 말한다. 대면식이 끝나면 약 일주일에서 이 주일 간격을 두고 다음 윗 기수 선배를 만나 또 다른 대면식을 갖는다, 그렇게 열 기수 정도 거슬러 올라가면 한 기수의 대면식이 비로소 끝난다. 선배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는 대면식 때 선배에게 제출할 자기소개서를 한 부씩 써야 했으며, 만날 기수의 이름뿐 아니라 이메일, 소속 부서, 심지어는 단독 기사 헤드 등을 모조리 외워야 했다. 도대체 기사를 잘 쓰는 것과 선배 기수의 정보를 토씨 하나까지 달달 외우는 것이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으나 수습 때부터 ‘찍힐’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대면식 날, 우리는 퇴근 후 약속 장소로 향하기 위해 택시를 나눠 탔다. 한겨울이라 오후 일곱 시도 안 되었는데 몹시 어둑했던 거리가 기억난다. 미리 숙취해소제도 나눠 먹은 우리는 지하의 한 파티룸 앞에 도착했다. 모두가 잔뜩 긴장한 채, 마치 어설픈 아이돌처럼 줄을 지어 계단을 내려갔다.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과 함께 문을 열고 들어가자 선배 한 명이 우릴 맞이했다. 사실 맞이했다기보다는 피곤한 눈빛으로 우리를 슥 훑어본 것에 가깝다. 그는 차가 막혀 아직 선배들이 모두 도착하지 않았으니, 먼저 앉아 있으라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시켜 줄 테니 말하라고도 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선뜻 무엇이 먹고 싶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선배는 치킨, 보쌈, 피자 등의 음식을 대중없이 시켰다. 음식이 도착할 즈음 해서 나머지 인원들이 모두 도착했다. 도저히 나이대를 가늠할 수 없는 그들에게서 어쩐지 묘한 위압감이 느껴졌다. 알고 보니 그들 중에는 나보다 두 살 가량 어린 사람도 있었고, 반대로 여덟 살은 더 많은 이도 있었다. 나이는 달랐지만 하나같이 조금씩 피곤하고 어딘가 지친 모습이었다. 우리를 포함해 열 몇 명의 인원이 식탁에 둘러 앉자 비로소 본격적인 대면식이 시작됐다.
분위기는 무겁고 경직되어 있었다. 선배들은 우리가 인쇄해 온 자소서를 한 부씩 나눠 가진 후 순서대로 우리의 이름을 호명했다. 이름이 불린 사람은 자소서 내용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다. 자소서의 어떤 부분이 이러이러하니 다음 기수 선배와 대면식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 고치라는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었다. 자소서는 이렇게 대면식을 거치며 수정되고, 더 좋은 방향으로 고쳐져야 했다. 엉망인 자소서를 높은 기수 선배에게 보였다가 그 질책이 고스란히 아래 기수 선배에게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잡담은커녕 정자세로 편 허리를 굽힐 수도, 무릎에 가지런히 올려놓은 주먹을 내려놓을 수도 없는 분위기 속에서 화살처럼 각자의 자소서에 피드백이 꽂혔다. 모두가 듣는 앞에서 그건 분명 유쾌한 일은 아니었다. 나는 다행스럽게도 꽤 본격적인 취미가 많았고, 자소서에 녹여 쓸 내용도 많았다. 취업 직전까지 음반과 ep를 내며 활동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요리에 대한 이야기, 한창 모았던 수집품을 엮어 썼다. 입사용 자소서에는 전혀 쓰지 않은 내용이었다. 몇몇은 관심을 보였고, 재미있다는 듯 웃기도 했다.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무난히 넘어갔다고 생각했다.
첨삭이 끝나자 비로소 식사가 시작됐다. 선배들은 편하게 대화하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누구도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그 때문에 나는 거의 체할 지경이었다. 이미 우리와 정확히 같은 과정을 거쳐 온 선배들은 그 점을 익히 알고 있는 듯했고, 경직된 분위기를 풀기 위함인지 다정하게도 일부러 우리에게 이런저런 질문들을 했다. 비록 의례적인 것들이긴 했지만, 일단 대화가 길어지자 긴장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한 선배가 내게 말을 걸었다. 그건 앞으로의 대면식 때마다 나를 괴롭힐, 꿈에서도 감히 상상하지 못한 종류의 질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