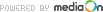[편집자주] 해당 기고문은 필자의 요청에 따라 가명으로 게재됩니다.
자네 아버지가
말인즉슨 경찰인 그가 다른 경찰을 고소한 사건이었다. 팀장은 격양된 목소리로 사건의 경위를 이야기했다. 거친 경찰 생활을 오래 한 그는 말보다 뉘앙스와 몸짓이 더욱 익숙했다. 그의 팔뚝에 새겨진 흉터처럼 그의 말은 느낌과 감각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슬프게도 나는 그러한 말을 그대로 옮길 수 없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다. 나는 그의 말소리 높낮이나 손발짓과 같은 감각적 언어들을 기사의 언어로 정리해야 했다. 그건 머리 아픈 작업이었고 꼭 이런 식이었다.
“그러니까 킥스로 내가 확, 시간이 다르잖아. 완전히 사시미야, 사시미.”
“그러니까 확, 했다는 게 정확히 무슨 의미... 그리고 사시미요?”
“답답하네, 그러니까 시간이 다르니까, 콱, 흔적, 꼬리를 잡아냈다는 거지. 그거랑 청첩장으로. ”
“청첩장은 또 뭔데요?”
두 시간 동안 팀장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사건의 개요를 이해할 수 있었다. 휴일에 자전거를 타던 그가 모종의 이유로 다른 경찰과 시비가 붙게 되었고, 그 해결 과정에서 상대방 경찰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잡음이 생겼다는 것이 대략적인 야마였다. 더불어 그는 자신이 공권력 오남용의 무고한 피해자임을 주장했다.
한창 일선 경찰들의 언행을 문제시하던 기사가 나오던 시기였다. 따라서 방금 전해 들은 이야기 역시 기사화, 그것도 단독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사를 써도 되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팀장은 의외로 흔쾌히 허락했다. 은근히 기대하는 듯 기왕 쓰는 거 속이 시원하게 써 달라는 말을 덧붙이기까지 했다. 녹취록을 빨리 풀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했다. 급하게 경찰서 현관을 나서는 나를 붙잡고 그가 물었다.
“참, 그런데 자네 아버지가 어디 경찰서에 계신다고 했지?”
나는 그제야 팀장이 내게 사건의 개요를 그토록 순순히 이야기해 준 이유를 깨달았다. 그는 다른 기자와 나를 혼동했던 것이다. 경찰을 부모로 둔 그 기자에게는 참으로 미안한 일이지만, 내게는 다시 오지 않을 행운이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듯 되묻자, 일순간 그의 표정이 굳었다. 그러나 나는 이미 모든 이야기를 토씨 하나 놓치지 않고 녹음해 둔 상태였다.
다음 날 아침, 보고를 받은 선배는 크게 흥미를 보이며 추가취재를 지시했다. 캡에게 취재 내용을 보고할 생각이니, 사건 개요를 꼼꼼히 정리해 보라는 조언도 했다. 술을 한 잔 마신 것처럼 가슴이 뛰고 피가 도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의 개요를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잠시 망설이던 그는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다는 듯, 자신이 사는 곳 인근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이야기하자고 대답했다.
엎으면 안 될까요
나는 휴일에 그를 만나 해장국을 함께 먹었다. 취재원이 피해자인 동시에 경찰이라는 사실이 신선하기는 했지만, 문제가 있었다. 그는 해장국을 먹으며 자신이 왜 피해자인지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동시에, 상대방이 어떤 교묘한 수법으로 공권력을 활용해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는지에 대한 추측을 사실처럼 늘어놓았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한 귀로 듣고 흘렸을 일방적이고 과격한 주장들도 섞여 있었지만, 팀장은 일선에서 30년을 구른 베테랑 경찰이었다. 증거라고는 없는 주관적인 추측도 그가 말하면 그럴듯한 추리가 됐다. 나는 다소 혼란스러운 상태였지만 일단 그의 주장들을 열심히 받아적었다.
보고 내용을 전송받은 선배는 내용이 퍽 흥미롭다며 흡족해했다. 한편, 증거 없이 일방적인 주장밖에 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들도 더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가 현직 경찰인 만큼 아무런 증거 없이 그런 추측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니 조금 더 알아봐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나는 취재 내용의 논리적 구멍을 메우기 위해 팀장에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화했다. 한번은 곤히 자던 그를 깨우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게 단 한 번도 짜증이나 화를 낸 적이 없었다. 오히려 매번 처음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건의 개요를 차근차근 설명해 줬다. 객관적 증거가 부족해 보인다는 내 걱정에 그는 자신의 모든 주장에 객관적 증거가 있으며, 나에게 그걸 건네줄 수도 있다고 자신 있는 어조로 단언했다. 나는 그렇게 정리된 내용들을 잘 짜 맞춰 보고했고 덕분에 무사히 그 주 지면 배치를 받을 수 있었다. 사회면 단독이었다.
모든 게 순조로워 보이던 그때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겼다. 기사 발행 이틀 전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그가 말한 증거를 건네달라고 요청했다. 사실상 기사화의 마지막 단계였다. 그러나 팀장의 대답은 나를 충격에 빠뜨리기 충분했다.
“증거? 무슨 증거. 내가 말한 게 다 증거지 뭘”
“네?, 저번에 말씀하셨던 그 서류들은요."
“그런 건 없는데. 내가 그런 게 있다고 말했나? 그리고 그게 뭐가 중요해. 내가 30년 차 경찰인데, 증거가 없어도 직감으로 알지.”
당황스러웠다. 이럴 수는 없는 일이었다. 내 보고를 전해 받은 선배도 당황해 그게 무슨 말이냐며 수화기 너머로 되물었지만, 나는 눈을 질끈 감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내심 기사가 엎어지기를 바랐지만 이미 지면 배치를 받은 상황에서는 엎질러져도 너무 엎질러진 물이었다. 나는 내 첫 단독 기사가 허위사실 유포가 될 것이라는 불안에 사로잡혀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천만다행으로 취재원의 ‘주관적 추측’ 혹은 ‘추리’는 어느 정도 맞아떨어졌다. 내가 패닉 상태에 빠졌음을 눈치챈 선배가 가해자로 지목된 경찰을 따로 만나 추가 취재를 개시한 것이다. “정말 뭐라 드릴 말씀이 없으며", “잘못했다면 욕을 달게 먹겠다” 는 그의 발언은 팀장의 추측이 사실임을 충분히 암시하고도 남았다. 취재를 마친 선배는 ‘역시 경력직의 감을 무시하면 안 된다'며 혀를 내둘렀다. 그제야 나는 다소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그렇다 해도 기사는 다소 두루뭉술한 톤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사실관계는 부족했고, 누군가의 주장을 옮긴 문장이 많았다. 미지근하고 무딘 기사와 달리 댓글창은 뜨거웠다. 사람들은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여당 지지자는 이것이 야당 탓이라고 주장했고, 야당 지지자들은 그 반대였다. 순간 내 기사가 어떤 기사적 가치를 지니는지에 대한 의문이 머리를 스쳐지나갔다. . 나는 내 보도가 어떤 관점이나 사실을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했어야만 했지만, 내게는 그럴 만한 여유가 없었다. 나는 첫 단독 기사를 무사히 냈다는 안도감에 취해 있었다. 저널리즘의 대원칙보다는 내가 속한 집단에서 인정받고 하루하루 살아남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다시 대면식
대면식이 있는 날에는 마와리가 일찍 끝났다. 마와리만 일찍 끝난다면 막노동을 해도 좋았지만, 대면식은 이야기가 조금 달랐다. 반쯤 탈진한 상태에서 따뜻한 실내에 앉아 있자니 잠이 쏟아졌다. 그 상태에서 선배들이 권하는 술은 그야말로 수면제에 가까웠다. 신입 기자가 대면식에서 꾸벅꾸벅 조는 사태가 일어나면 어떤 소문이 어떻게 날지 모르는 일이었다. 혹여 말실수라도 할까 싶어 나와 동기들은 모두 바짝 긴장한 상태였다.
대면식 당일에 나는 삼 일째 샤워는커녕 머리도 감지 못한 상태였다. 한겨울이라 체취가 묻히는 것이 다행이었다. 게다가 첫 대면식 때 선배가 했던 조언도 한몫 거들었다. 대면식 때는 최대한 피곤하게, 그리고 꼬질꼬질한 채로 가야 ‘마와리 편하게 한다’는 공격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의 조언을 충실히 따른 덕분인지 대면식 장소에서 나를 만난 동기는 ‘노숙자인 줄 알았다’며 경악을 금치 못하기도 했다.
선배들은 대면식 장소에 우리보다 늦게 도착했다. 모두 피곤하고 지친 표정이었다. 그중 양복을 입고 키가 작은 남자 기자가 우리를 보며 능글맞게 웃었다. 본능적으로 그가 오늘의 빌런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지난 대면식과 마찬가지로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 술잔을 두어 잔 비운 후, 그가 나를 지목하며 다짜고짜 물었다.
“니가 랩 한다는 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