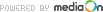[편집자의 말] ‘에큐메니칼’(ecumenical)은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뜻하는 말로 그리스어의 ‘오이케 오’(οκω), 곧 ‘살다’라는 뜻의 단어에서 파생된 ‘오이코스’(집, 가정, 세상)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단어의 시작은 동서방 교회의 일치를 상징하는 것으로 주로 개신교 교회에서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 종교 화합과 진정한 종교가 무엇인지 신학 전공인 기자의 눈으로 살펴봅니다.

매년 5월 1일은 노동절이다. 한국에서는 ‘근로자의 날’이라고 불리며 다양한 직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기념하는 날이다.
노동절은 1886년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에서 유래됐다. 당시 미국의 노동 운동은 마르크스주의자를 비롯한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이들이 주도하고 있었는데, 시위에 참여한 약 8만명의 노동자들은 8시간 노동을 보장 받기 위해 파업과 시위를 진행했다. 전반적으로는 평화적인 시위였지만 경찰의 시위 해산 시도에 누군가가 사제폭탄을 던져 사망자와 부상자가 다수 나온 사건이다. 이후 헤이마켓 시위는 국제적인 노동 운동의 상징과 같은 사건이 되었고 5월 1일을 ‘국제 노동절’로 지정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교 관점에서 바라본 노동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선 노동에 관한 성경 속 내용을 보면 직접적인 언급이 있지는 않지만, 관련하여 간접적으로 언급하는 부분이 있다. 시편 128장 2절에 ‘네 손으로 벌어들인 것을 네가 먹으리니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이 있어라.’고 노동에 대해 긍정적 관점을 나타내는 말씀을 볼 수 있다.
그리스도교 내에서는 특히 개신교와 가톨릭, 정교회의 노동관을 살펴볼 수 있는데, 개신교의 경우 대표적으로 마르틴 루터와 장 칼뱅이 말한 ‘직업소명론’을 통해 알 수 있다.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다’는 입장 아래 노동에 대해 ‘모든 정당한 노동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일부분’으로 바라본다. 또한 루터는 “하나님은 각자 다른 직업을 주셨고,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봉사하는 것이 소명이다”라고 주장하며 직업소명론을 뒷받침했다.
장 칼뱅은 마르틴 루터의 직업소명론을 조금 더 구체화 시켰는데, “하나님은 각 존재를 특정한 삶의 영역으로 인도하며 충실히 일 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다”라고 주장하며 그리스도교의 핵심 교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강조했다. 직업소명론은 노동의 존엄성 회복과 더 나아가서는 현대 사회의 소명의 관점을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가톨릭은 1891년 교황 레오 13세에 의해 ‘노동문제에 관한 교서(Rerum Novarum)’를 승인, 발표하며 노동자의 권리와 공정한 임금, 노동자를 위한 노동조합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노동자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첫 입장이다.
이후 가톨릭은 5월 1일을 성 요셉 노동자 축일 (Feast of Saint Joseph the Worker)로 지정하여 가톨릭의 노동관을 확립했다. 성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부라는 상징성과 나사렛의 목수였기에 노동의 모범적 인물로 여겨지고 있고 이 축일은 노동과 노동자들에 대한 묵상과 노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기억하는 날로 기념하고 있다.
반면 정교회의 노동관은 개신교나 가톨릭과는 달리 조금 더 영성적인 접근을 보이고 있다. 정교회에서는 노동이 ‘내면 정화와 겸손을 배우는 기회’라 보며 ‘수도적 삶의 연장선이자 하느님께 나아가는 수단’으로 인식한다. 또한 개인의 노동이 ‘타인과 공동체에 대한 영적 봉사’로 바라보기도 한다.
정교회의 경우 노동에 대한 절제 또한 필요하다 본다. 노동이 삶에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며 노동이 삶에 우선순위가 되는 것을 경계한다. 특이한 점으로는 이콘(성화)를 그리는 것도 노동이 아닌 신심 행위로 바라본다는 점 또한 정교회만의 독특하고 영성적인 노동관임을 알 수 있다.
글을 마치며 성 바실리오스의 노동에 대한 발언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노동절을 맞아 이 세상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을 통하여 빛나기를 기원한다.
“노동하지 않는 수도사는 기도할 자격도 없다.”
+ 주님과 함께
김동현 기자(mvp2450@naver.com)
편집인: 조우진 편집국장 (국제 21)
담당 기자: 김동현 기자 (신학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