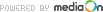내가 좀 퀴어일 수도 있지 왜 난리세요..?
보편적인 인문계 고등학교의 안 보편적인 이야기

(이 글은 외부 기고문입니다. 글을 기고해주신 익명의 학우 분께 감사드립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다양한 폭력이 일어난다. 그 중 학교 폭력, 체벌, 교권 침해 같은 건 모두가 알고 있다. 너무 일상적이며 걸렸을 때 학교가 상당히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니까. 모두가 알고 있지만 묵인되는 폭력도 있다. 여성혐오, 특정 누군가를 향한 비하와 혐오 발언 같은 것들. 전자는 법적으로라도 처리할 수 있다. 후자는 악질적이다. 소수자의 위치에서 스스로가 폭력의 피해자라는 걸 드러내는 건 어렵다. 드러내는 순간 학교라는 ‘작은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한다.
드러내지 않는다면 계속 된다. 도와주는 이가 없다. 드러낸다면 사회적 매장에 가까운 대우를 받게 된다. 결국에는 드러낼 수도, 드러내지도 않을 수도 없는 중간 상황에 놓인다. 인문계 고등학교의 소수자는 그렇게 살아간다.
내가 숨긴 나는 누구일까?
나는 성소수자다. 이 사실과 무관하게 다들 나를 ‘헤테로’, ‘시스젠더’, ‘남성’으로 본다. 그 중에서도 사회적으로 ‘남성적’이라고 정해진 것들을 답습하며 살아갈 것을 기대 받는다. 여자의 손을 낚아채는 건 ‘박력’이고 남자의 손을 낚아채는 건 ‘동성애’란다. 전자든 후자든 폭력인데 말이다. 이런 식이다. 3년 간 내가 봐온 것들은 폭력에 무뎌진 사람들이었다.
본능적으로 안다. 말하면 내일부터 삶이 괴로워진다. 괴로워지지 않으려면 어울려야 하는데, 그것도 싫었다. 자습 시간에 TV에 틀어놓은 걸그룹 직캠에 열광하고, 같은 반 여학생들의 외모를 평가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사상이 빻은 거라고’ 매번 말한다. 그랬더니 나는 ‘진지충’이 되었다. 그런 친구들과 어울리기 싫어 혼자 다닌 적도 많았다. 사상의 동지는 고사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볼 친구도 없었다.
대신 내게 혐오 섞인 말을 하지는 않는 친구들이 있어 고마웠다. 그 친구들이 내 뒤에서 소수자 혐오 발언을 한다 해도, 내 앞에서 얘기 안한 건 배려였을까. 사실 그게 진심이든 배려든 괜찮다. 내 귀에만 안 들리면 된다는 게 최선이었다. 그리고 가뭄에 콩 나듯 소수자성을 포용해주는 친구들, 그 친구들과도 차별하는 사람이 나쁘다는 얘기를 했지만 내가 성소수자라는 걸 밝힐 수는 없었다. 얘기하지 않는 게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작은 사회에서는 돌아다니는 소문조차도 위협적이다. 소문은 빠르게 퍼지지만 해명에는 관심 없는 사람도 많았으니까. 그래서 학교를 다니며 말한 사실은 “선생님 머리에 분필 가루 묻었어요.” 밖에 없다.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며 학습한 결과다.
연애, 나도 해봤는데
대외적으로는 헤테로 시스젠더 남성이니까, 사실은 바이섹슈얼 남성이니까. 여성과, 남성과 연애를 해봤다. 둘의 차이는 드러낼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다. 여성과의 연애는 드러낼 수 있다. 학교 안에서 만난 사람이었고, 다들 연애하는 걸 알고 있었다. 남성과의 연애는 드러낼 수 없다. 모든 게 마음에 걸렸다. 학교 밖에서 만난 사람과, 절대 우리 학교 사람이 다니지 않을 지역까지 가서야 만났다. 얘기는커녕 내가 연애 중이라는 사실조차 말할 수 없다.
인문계 고등학교의 ‘연애’는 한국 사회의 연애에 대한 인식을 답습하는 동시에 드라마와 웹소설을 통해 학습할 수 있는 어줍 잖은 판타지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매우 구린 경험이다. 그 속에 성소수자의 연애는 배제되거나, 기괴하게 소비된다. 남성간의 연애는 상당히 극적으로 그려지거나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의 ‘팬픽’을 통해 투영된다. 근데 나는 소수자지만 그렇게 연애한 적 없다. 주변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게 연애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똑같다. 똑같이 만나서 똑같이 연애한다. 다만 드러내기 매우 조심스러워 손도 안 잡고 다녔다. 그게 전부다.
근데 언급 되었을 때 덧씌워지는 이미지는 혐오를 기반으로 한다. 서울 도심에 가끔 나타나는 현수막들, ‘동성애는 치료될 수 있다’, ‘동성애는 성중독이다’. 이 논의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했다. 성소수자의 연애를 언급할 때 나오는 얘기는 이런 식이다.
“여자한테 큰 상처를 받아서 여자를 못 만나는 거 아니야?”
“네가 게이면 나 막 덮치고 그런 거 아니야?”
“이XX 목사님 알아? 동성애 치료 된다 그러던데.”
대환장쇼다. 근데 이런 얘기 자주 들린다. 나는 뭐라 말해야 하는가. 난 이성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갖고 기피하는 미친 BL 소설의 주인공도 아니고, 그런 빻은 말하는 사람한테 그런 욕망을 느낄 리도 없다. 그리고 치료는... 아픈 것도 아닌데 왜.
그러다 보니 연애는 음지화 된다. 문제는 도움 청할 곳이 없어진다는 것. 주변에 물어보자면 내 스스로를 아웃팅 시키는 꼴이니. 그렇다고 터놓을 곳이라고는 인터넷 커뮤니티.. 지만 거기에 물어볼 바에 차라리 벨벳 골드마인 류의 영화를 열 번 더 보는 게 유익할 수도 있겠다.
당당, 할 수 없어
인문계 고등학교를 벗어나는 건 즐거운 일이다. 매일 부대끼는 누군가의, 매일 자주 이야기 하는 것들 ‘연애’, ‘섹슈얼리티’, 그런 것들. 말할 수 없다. 나는 디폴트 값으로 살아간다. 헤테로 시스젠더 남성인 척 아주 충실히 살았다. 대학에 기대가 컸나보다. 나는 내 소수자성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생길 줄 알았다.
근데 대학을 다니며 딱 두 명에게 이야기했다. 두 명. 나는 인싸가 절대 아니다. 친구는 몇 명 있다. 그 친구들과 매일 누군가와 함께 즐겁게 대화하고 살고 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군가에게 여전히 디폴트값은 헤테로 시스젠더다. 소수자성을 이야기할 때 만큼은 호혜적이고 자신의 포용성을 이야기 하는 사람들. 나는 아직 그것조차 불편하다. 나의 피해의식일 수도 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마주하지 못했으니. 하지만 그 호혜와 포용을 통해 드러내려는 쿨한 스스로의 모습, 그런 이미지 마케팅은 너무 괴롭다. 뒤에서는 혐오하다가도 앞에서는 조곤조곤 혐오가 나쁘다는 학우 누구에게, 거기에 동조한 또 다른 학우 누구에게.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나를 죄악시했던 누구에게. 나는 내 나름대로 당당하게 잘 살고 있다고, 뭐 어쩔건데. 말하고 싶지만 난 아직 고민이 많다. 나도 내 섹슈얼리티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 싶어. 특수 케이스도 아닌 내 삶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