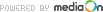흔히 학보사 기자들이 모여하는 이야기 소재는 패턴이 비슷하다. 우선 언제, 누가, 어떻게 퇴사할 건지 그야말로 서로를 기만한다. “에이~ 난 국장까지 해야지”부터 “난 올해 안에 퇴사한다”까지. 그동안의 경험을 비추어보면 모두 말과 행동이 정확히 반대였다. 그 다음 ‘누가 가장 입사를 후회하는가?’ 대결이다. 이어서 이번 기사를 마감하면서 어떤 기자가 ‘가장 고되게’ 기사를 마감했는지 가려내기까지. 이 세 단계의 정형화된 대화가 늘 이어진다. 마치 남자 선배들이 모이면 똑같은 소재의 ‘군대’ 이야기나 친한 친구들끼리 만나면 늘 하는 이야기를 마치 처음 같이 풀어내는 것처럼 말이다.
■ 대부분의 지방대 학생들, 대학 이름 ‘스펙’으로 못 내세우는 암울한 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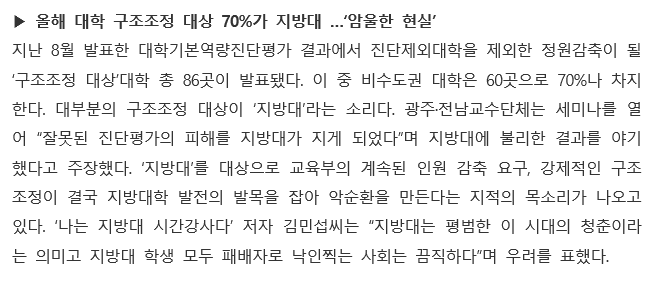
대부분의 지방대 학생들은 학벌주의 아래 굴러가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미 패배한 것으로 간주되고, 이들은 ‘2등 시민’으로 분류된다. 그나마 인서울 주요 대학의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대학 이름을 스펙 삼아 활동할 수 있지만 다수의 지방대 학생들은 학교 이름 때문에 흔히 좋은 직장이나 큰 꿈을 생각하는 것을 스스로 단절하는 경우가 많다. 지역 인재 전형이나 공기업, 공공기관 아니면 공무원 등 그나마 학벌을 덜 반영하는 직종과 직장을 위해 열심히 공부한다. 또 자신의 취업이나 사회적 생존과 관련된 것에만 대학 재학 4년 내내 몰두한다. 지방대를 다니는 주변 친구들에게 “너네 큰 꿈을 가져본 적이 있냐”라고 물으면 대부분 “우리 같은 지방대가 무슨 그런 걸 생각하니”같은 패배의식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그나마 교원자격증이라도 주는 사범대에 온 게 다행이다”라고 대답한다. 이렇다 보니 사실상 이외 분야인 ‘학보사’에 열정을 쏟기 어렵고 관심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오히려 밖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게 ‘별종’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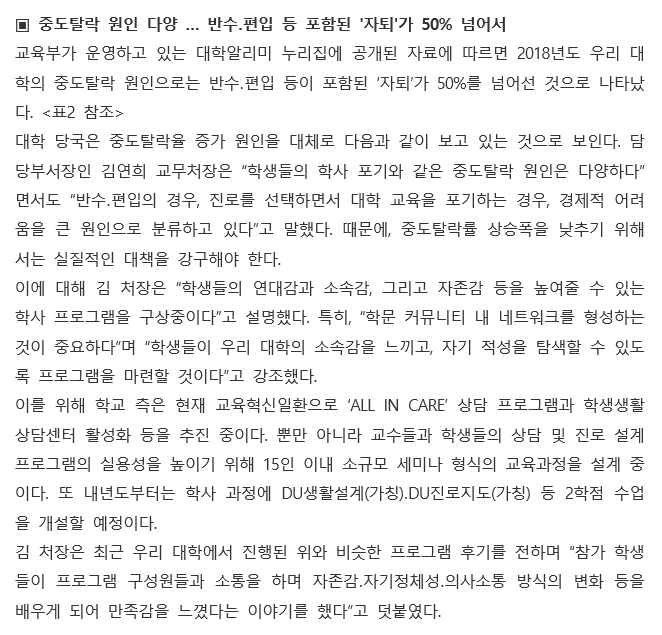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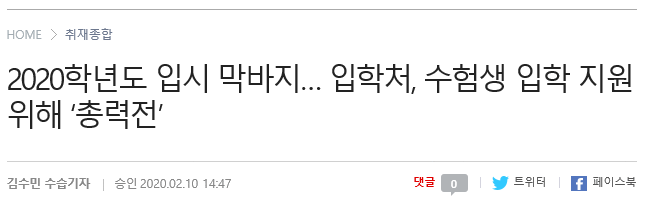
■ 안 그래도 생존하기 더 어려운 지방대 대학 본부 …
학보사를 더욱 ‘걸림돌’로 볼 수 밖에
더 나은 공부 환경을 위해 ‘서울행’을 택하는 반수, 편입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 지방대의 중도 탈락률이 ‘위험 수위’까지 도달해버린 상황이다. 게다가 입학 세대들이 지방대를 점점 기피하고, 인서울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니 지방대 입장에서도 신입생을 충원하기 위해 골머리를 앓는다. 빠져나가는 학생은 많은데, 들어오는 학생은 줄고 골치 아픈 대학 본부 입장에선 사실상 ‘내부 비판 기구’나 다름없는 지방대 학보사를 반가워할 리가 없다. 예산을 더 냉혹하게 삭감시키거나, 지면 발행을 대폭 축소 하거나 중단이나 안 하면 다행이다. 취재 지원비, 기자 교육 같은 촘촘한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물론 이 같은 점은 인서울과 수도권 학보사 대부분이 겪는 일이겠으나, 지방대 학보사가 궁지의 몰리는 속도가 이들에 비해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기자들 입장에서도 굳이 이 조직에서 버텨 나갈 이유가 더 빨리 사라져 간다.
■ 학보사 그만 두는 이유에 ‘괴리감’, 부담감’ 입 모아 …
실제로 지방대 학보사 기자들과 만나 왜 기자들이 신문사를 중도에 그만두고 나가는지 이야기해보면 대부분 ‘기자 업무에 대한 괴리감과 자괴감’, ‘업무에 대한 부담감’을 입에 올린다.
대학교 4년 내내 우리 학보사 최일선에 있던 신문사 선배 국장도 기자들이 업무를 그만두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까지 깊고 까다롭게 기자 업무를 해야 하나?”라는 자괴감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선배 국장은 그간 경험상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신문사에 호기심을 가지게 되어 입사한다는 것이다. 막상 기자 생활을 하기 위해선 자기 스스로 기자 업무에 대해 공부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호기심만으로 해쳐나가기엔 너무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신문사에 들어오면 학내 이슈, 시사 등 전반적인 사회 흐름을 파악해야 하고, 글쓰기 기술도 점차 중요해지는데 이것이 기자들 스스로에게 부담감과 막중함이 겹치며 서서히 목을 조여 온다. 또 다른 지역 대학의 학보사에서 편집국장을 역임했던 아는 형은 기자들이 학보사에 열정을 쏟을 만큼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가뜩이나 무한 경쟁 시대인 현 사회에서 개인이 학보사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 많고, 거기에 따른 부담이 크다는 이유다.
또 한 학기 동안 수습기자를 하고 그만둔 지방대 학보사 출신 친구도 자신이 기자 업무를 그만둔 이유에 대해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라 괴리감이 느껴진다”라고 말했다. 뭔가 고상한 업무를 할 줄 알았는데 실제론 현장에 이곳저곳 뛰어다녀야 하고, 고생한 것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생각보다 학보사 구조가 수직적이고 까다로운데 비해 내부 인원이 적다 보니 그 체계가 또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도 이유로 꼽았다. 충청권 대학의 학보사에서 편집국장을 역임했던 필자의 지인은 “신문사 업무가 상상했던 것과 너무 달라 괴리감이 느껴진다”라고 말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학생 기자가 돼서 학교 관계자들과 이것저것 인터뷰를 하며 나름 대학 내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했지만 정작 신문사에서 실제로 일을 해보면 업무들이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조직과 체계가 수직적인 점도 기자들을 더욱 힘들게 한다는 지적이다. 밤늦게까지 기사를 교열하는 업무, 신문 배송부터 원고료 정산 확인 같은 행정업무, ‘간사-주간교수’와의 관계 고려 등을 생각하면 갑갑함이 느껴진다고 전했다.
■ 편집국장도 자괴감 드는데 다른 기자 친구들은 오죽하랴
지방대 학보사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 편집국장 위치에서 기자들에게 일거리를 줘야 하는 나도 상당히 심적인 중압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다. 또 누군가 나에게 개인적으로 연락 와서 ‘“아 선배. 저 일이 너무 힘들어서 신문사 그만두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하면 어떡하나’와 같은 고민과 함께 기자들의 눈치를 본다. 이런 고민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에 ‘아, 진작 신문사 그만뒀어야 하는 건가.’하는 자괴감이 든다. 게다가 학보사 편집국장이기 이전에 나도 평범한 지방대 학생일 뿐이다. 학보사 업무에만 매달려 남들에게 괜히 뒤처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 수밖에 없다. 어떻게든 학보사를 살려보자는 마음가짐으로 버텨가는 나 조차도 이렇게 흔들리는데 다른 기자 친구들은 오죽하랴.
김규민 (대구대신문사 편집국장)
<지방대 학보사 기자로 살아남기> 시리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