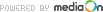*이 기사는 2025년 9월 발행한 회대알리 19호 지면에 수록한 기사입니다. 웹 발행을 위해 추가 수정을 거쳤습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일컫는 용어로, 2006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출범된 책임투자원칙(PRI)의 핵심 요소로 다뤄지며 본격적으로 부각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온실가스 배출 절감과 같은 ‘환경적 측면’과 임직원, 지역사회,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를 아우르는 ‘사회적 측면’, 투명한 감사 기구 운영과 같은 ‘지배구조적’ 측면을 뜻한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 가치, 즉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지표이다.

지속가능성이 대두된 배경에는 UN 산하의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 브룬틀란트 위원회)가 1987년 출간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보고서가 있다.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을 제시하며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면서도 미래 세대가 필요를 충족할 능력을 저해하지 않는 발전”이라고 정의한다. 넓게 보면 이를 정책 측면으로 발전시킨 것이 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 SDGs)이며, 이에 더해 민간 부분에서 구체화된 것이 ESG라고 볼 수 있다.
ESG가 구체화되고 정착된 데에는 유럽연합(이하 EU)의 영향이 컸다. EU는 SDGs 정책의 일환으로 지속가능금융(Sustainable Finance)을 제도화하면서 펀드, 연금 등의 금융 상품과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고 확장했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EU 기업과 공시 대상 금융 기관들은 ESG 관련 정보를 조사하고 공개해야 했으며, 투자자와 시민사회는 기업과 투자 상품의 지속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2023년 발효된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이하 CSRD)은 비EU 기업도 의무 대상이 될 예정이며, 가치사슬(value chain) 정보가 공시 범주에 속해 파급 효과가 크다.

CSRD의 실행 기준인 유럽지속가능성보고표준(ESRS)에 의하면 가치사슬은 사업 모델 및 사업체가 운영되는 외부 환경 및 관련된 활동, 자원 등 관계의 전 범위를 뜻한다. 즉 제품의 생산 단계(upstream, 이하 상류)만이 아니라 이후 과정인 사용 및 폐기 단계(downstream, 이하 하류)에서 야기될 수 있는 영향 또한 조사해야 함을 의미한다. 보고 범위는 ‘중대한 영향’으로 한정하지만, 해당 기업만이 아닌 협력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인권·노동 실태 또한 포함되어 비EU 국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속가능한 방위산업?
그러나 최근 들어 ESG 제도를 이끌어 온 유럽이 흔들리고 있다. 지난 5월 유럽 최대 전자증권거래소인 유로넥스트는 ESG를 에너지(Energy), 안보(Security), 지정학(Geostrategy)으로 확장한다고 발표했으며, 7월에는 이를 이어 항공우주와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본래 방위산업은 대표적인 죄악주(sin stock)로 여겨져 ESG를 지향하는 투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잦았다. 죄악주는 술·도박·담배·무기 등 사회 통념상 부정적인 영향을 일으킨다고 여겨지는 산업의 주식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또한 2024년 죄악주에 6조 원가량을 투자해 논란이 됐다. 특히 ESG 제도가 정착된 유럽의 금융 기관들은 이에 민감해 아예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를 배제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의 금융 기관들로 하여금 관련 제약을 완화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2022년 스웨덴의 대형 은행인 SEB는 자산운용 분야의 규정을 개정해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를 일부 허용했으며 지난 6월과 8월 허용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은행 분야에서도 규정을 개정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에 본사를 둔 경우 핵무기 기업과의 거래를 허용했다.
독일의 자산운용사 AGI도 지난 3월 지속가능성 펀드(article 8)의 규정을 개정해 군용 장비 및 용역 기업과 핵확산금지조약(NPT) 내의 핵무기 기업에 대한 투자를 허용했으며, 약 1.95조 달러(약 2,700조 원)를 운용하고 있는 스위스의 UBS 자산운용 역시 같은 시기 지속가능성 펀드의 방위산업 관련 규정을 완화했다.
다만 위 기관들 모두 논란 무기(controversial weapons)에 대한 금지 조항은 유지했다. 논란 무기는 EU 규정상 국제 협약으로 금지된 무기(대인지뢰·집속탄·생화학)만을 지칭하지만, 기관에 따라 더 광범위한 내부 정의를 두는 경우도 있다.
기관들이 일제히 방위산업 관련 규정을 완화한 것은 EU의 의지와 무관하지 않다. 2024년 발표된 유럽방위산업전략(EDIS)에 따르면 EU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해외 의존도 등을 사유로 방위비 지출 확대와 ‘유럽 방위기술과 산업기반’(EDTIB)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EU의 지속가능금융 체계 하에서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조항은 전무하다고 밝히며 지속가능한 금융 체계에 주권, 회복탄력성, 안보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방위산업이 평화와 지속가능성의 사회적 측면에 기여한다고 명시했다. 이후 6월 고시(Commission Notice)에서도 이러한 기조를 명확히 했으며, 논란 무기에 핵무기가 포함되지 않음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방위산업이 지속된다면
그러나 무기는 자국의 안보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이하 SIPRI)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간 상위 5개국(미국·프랑스·러시아·중국·독일)이 주요 무기 전체 수출량의 72%를 차지했다. 하지만 수요 지역은 아시아·오세아니아 33%, 유럽 28%, 중동 27% 등으로 세계 전역에 퍼져 있었다. 무기의 생산국과 수요국이 상이한 구조에서 어느 국가를 ‘선량한 국가’로 인정하고 무기 수출을 허용할 것인지는 생산국의 정치적 상황에 좌우되기 쉽다.
실제로 2023년 12월 인권단체 세 곳(Oxfam Novib, PAX, The Rights Forum)은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당국 법원에 전투기 F-35 부품의 이스라엘 수출과 환적을 중단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F-35 전투기를 사용하는 것은 국제인도법(IHL) 위반일 수 있으며 집단학살(genocide)에 기여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주장은 1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항소심에서 수용되어 7일 내 수출과 환적을 중단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후 법무관 의견서(AG)에서는 항소심 판결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 제시됐지만, 최종 선고에서 법원의 수출 중단 명령이 행정부에 대한 권한 침해로 판단되어 해당 명령은 파기됐다. 해당 사안이 국제인도법 위반인지 재심사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수출을 금지해야 한다고는 언급했지만 결국 최종 권한은 행정부에 있음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 외에도 방위산업 특성상 판매된 무기가 어떤 용도로 누구에게 쓰일지 판별하기 어렵다는 점도 위험으로 여겨진다. 플란데런평화연구소(Flemish Peace Institute)가 1월 발행한 보고서에 의하면 방위산업은 가치사슬의 하류를 추적하기 어려워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된다. 특히 정부의 수출 허가 제도 외에는 오남용을 막을 장치가 미비하여, 막상 무기가 사용되는 시기에는 이를 추적하거나 통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안보를 이유로 거래 과정이 기밀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가치사슬이 복잡하고 불투명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는 최종 사용자를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재판매 등을 통해 불법 시장으로 유통되거나 무단 사용될 위험을 초래한다.
실제로 2021년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면서 본래 아프가니스탄의 정부군 지원 용도였던 무기의 상당수가 탈레반으로 이전됐다. 미 정부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이 조달했던 무기 중 약 71억 달러(약 10조 원) 규모가 현지에 남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남은 무기들이 무장 세력들에 의해 쓰이며 안보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례로 파키스탄 당국이 무장세력으로부터 압수한 무기 중 63정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에게 제공했던 무기로 확인됐다.
미래를 대가로 팽창하는 산업

SIPRI의 데이터에 따르면 세계 군사비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해 명목 기준 2024년 약 2.7조 달러(약 3,750조 원)를 기록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증가 폭이 가팔라졌으며, 이스라엘-하마스의 무력 충돌 이후 이스라엘의 가자 공습이 지속된 것 또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년 대비 몰타를 제외한 모든 유럽 국가에서 군사비가 증가했으며 러시아는 38%, 이스라엘은 65% 증가했다. 분쟁 관련 사망자 수는 약 24만 명으로 27% 증가해 201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포격, 공습, 무인기 등의 원격 폭력과 폭발물 사건이 약 9만 8천 건으로 42% 증가했다. 이에 전 세계 강제 이주자는 총 1억 2,300만 명을 기록하고, 핵무기를 보유한 9개국(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인도·파키스탄·북한·이스라엘)은 모두 현대화를 진행해 핵전력을 강화했다.
이런 상황은 단순히 군사비만을 늘리지 않았다. 우크라이나와 가자·서안지구의 신속 피해 및 수요 평가 보고서(RDNA)에 의하면 향후 10년간 2024년 12월 기준 우크라이나의 복구 필요 자금은 약 5,240억 달러(약 730조 원)이며, 가자·서안지구는 2024년 10월 기준 532억 달러(약 74조 원)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분쟁과환경관측소(이하 CEOBS)가 5월 발행한 보고서에 의하면 EU가 목표한 방위비 동원 계획이 이행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약 9,800만 톤에서 2억 1,800만 톤이 증가하며 이를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하면 연간 1,340억 달러에서 2,980억 달러(약 186~414조 원)의 피해가 추산된다. 이는 4년 내 이행을 가정하고, 미국을 제외한 NATO의 31개국의 영향만을 고려한 추정치이다. CEOBS는 고려되지 않은 다른 지역 또한 군사비 지출을 늘릴 경우 파리협정의 2℃ 목표조차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방위산업은 이처럼 세계가 지속 불가능해질 때 팽창하는 역설적인 산업이다. 군비 확장이 정당화되고, 전쟁의 참상이 들려올 때 ‘호재’가 되는 산업을 지속가능한 미래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떤 워싱 행위보다 가장 치명적인 미래로 향하게 할 수 있다.
취재, 글, 디자인 = 주미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