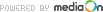‘인공지능(AI) 전선’에 뛰어든 대학들의 커리큘럼이 급격히 변화하는 가운데 인문계(대학입시 기준, 인문·사회 계열) 학생이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이 같은 현실에서 인문계 학생도 AI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탄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학가, 너나없이 AI 교육 도입 중
많은 대학이 ‘AI 인재 확보’를 외치며 경쟁적으로 교육 정책을 펼치고 있다. 동국대학교는 첨단분야 학과를 서울 소재 대학 중에서 가장 많이 증원하면서(89명) AI 중심 학과인 ‘의료인공지능공학과’와 ‘지능형네트워크융합학과’를 신설했다. 중앙대학교도 AI 학과와 산업보안학과의 정원을 늘리면서 의료 AI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점진적인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단국대학교는 ‘AI 캠퍼스’ 조성을 위해 단과대별 ‘AI-PD(Program Director)교수’를 배치했다.
인문계 학생의 좁은 취업길, 여전히 ‘문송합니다’
AI 중심으로 교육 과정이 재편되는 시대에 인문계 학생들은 여전히 취업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3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를 보면 인문계 취업률은 ▲인문계열 61.5% ▲사회계열 69.4%로 나왔다. 전체 대졸 평균 취업률 70.3%보다 낮은 수치다. 산업 전반에서 기술 기반 직무가 확대되면서 인문계가 기존의 강점만으로는 노동시장에 접근하기 어려워진 구조적 문제가 반영된 결과다.
이에 인문계 학생들은 대학원 진학이나 복수 전공 등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서울 소재 대학교에서 경제학과를 다니고 있는 A 씨는 “인문계열 단일 전공만으로는 취업이 어려울 것 같다”며 “학사로는 부족할 것 같아 대학원 진학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동국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 중인 B 씨는 SK하이닉스의 올해 신입사원 623명 중 문과는 4명에 불과했던 점을 지적하면서 “사기업이 인문계열 인재를 잘 뽑지 않아, 전문직(로스쿨)이 살길인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문계열은 이제 AI 관련 복수전공이나 최소 상경 계열(경영·경제) 복수전공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균형·실용적인 교육과정 개편 요구돼… 인문계 학생도 ‘AI 핵심 인재’로
인문계 학생이 AI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선 기존의 분리된 교육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윤동열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문·이과 학생 교육은 균형적이라 보기 어렵다”며 “인문계열 학생 취업난의 근본 원인은 ‘인문은 이론, 이공은 실습’ 중심으로 구분된 교육제도와 산업 구조의 부조화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실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인턴십과 현장 중심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통합적 산학협력 모델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직무 경험을 일찍부터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인문계 학생들이 ‘기술을 해석하는 주체’로 거듭나기 위한 융합 교육도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 교수는 “사회 전반에서 인문학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인문계열생이 다양한 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 나가야 한다”며 “지금 인문계열 전공 학생에게 필요한 역량은 문제 정의력, 분석적 사고와 데이터·AI 리터러시”라고 밝혔다.
대학 총장들 “AI 활용에 인문학적 능력 필요해”
대학 총장들도 AI 중심 커리큘럼에는 인문학적 능력과 문제의식이 필수적이라 보고 있다. 윤재웅 동국대학교 총장은 지난 24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AI는 본질적으로 기술에 불과하기에 인문학을 결합하지 않으면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기 어렵다”며 “교육 과정 전반에 AI 활용을 필수적으로 도입하되, 인문학적 교양을 바탕으로 한 질문 능력을 결합하는 플랜을 만들 것”이라 밝혔다.
이향숙 이화여자대학교 총장도 “AI 시대에는 기술 그 자체보다 그 기술이 인간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가 더욱 중요한 질문이 되고 있다”며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이공계뿐 아니라 인문·사회계열의 깊이 있는 통찰과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난 8월 한국대학신문 인터뷰에서 말했다.
체계적인 인문·AI 융합 커리큘럼 도입 과제로 남아
다만 대학의 AI 융합 교육이 빠르게 확산하는 만큼, 실제 교육 인프라와 커리큘럼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Language & AI학부’와 ‘Social Science & AI학부’ 도입으로 AI 융합 교육을 작년부터 선보인 한국외국어대학교는 현재 교육 인프라와 커리큘럼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Language & AI학부 2학년 C 씨는 “학부 내 실습실이 부족한 상태”라며 “현재 전용 강의실이 단 1개뿐이라 신입생이 추가로 입학하면 학습환경이 더 열악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Social Science & AI학부 2학년 D 씨 역시 “현재 전공 커리큘럼이 불명확하고 전공 강의 수가 부족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한국외대 서울캠 총학생회혁신위 역시 “두 학부 모두 3·4학년 커리큘럼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않았으며, 특히 Social Science & AI학부의 경우 1학년 1학기 전공 필수 과목이 부재해 신입생들이 교양과목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지난 7월 정책 해커톤에서 비판했다.
AI 인재 양성을 둘러싼 경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기술의 속도에 대응하기 위한 인간의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다루는 인문학의 역할이 오히려 더 중요해지고 있다. 대학이 기술 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문계 학생이 AI 시대의 핵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균형 있는 교육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외대알리 강승주 기자 (math.sang.ju@gmail.com)
대학알리 고아름 기자 (areumsecond@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