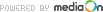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기리며

이태원 참사 이후 세 째 10월 29일이 되었다. 별이 된 159명의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3년의 시간을 쉬지 않고 걸어온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보낸다.
참사 3년 만에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인파 관리 소홀로 지목됐다. 23일 발표된 정부 합동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이태원에 인파가 몰려들 것이 충분히 예상됐음에도 경찰과 용산구청은 이태원이 아닌 대통령실 주변 집회 관리에만 집중했다.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대통령실 이전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놀러 온 2·30대 청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이다. 늦었지만 조금이나마 드러나고 있는 진실을 환영한다. 명확한 진상규명만이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의 삶을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
반복되는 참사의 경험은 청년 세대에게 상흔을 남겼다. 지금의 20대 청년들은 10대에는 세월호에서, 20대에는 이태원에서 또래 청년을 잃었다. 2022년 뉴시스 조사에 따르면 1995~1999년생 응답자의 97.3%가 본인이 참사 희생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나라가 더 안전해졌다고 느끼느냐는 질문에는 57.3%가 아니라고 답했다. 정부와 권력기관의 무능과 무책임이 또다시 반복되면서 청년들에게는 ‘각자도생’할 수밖에 없다는 감각이 점점 더 선명해졌다.
사회적 참사를 둘러싼 혐오발언은 침묵과 방관을 먹고 자란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2차 가해는 여전히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심각하다. 작년 이태원 참사 2주기 무렵 대학별로 유가족과 함께하는 간담회를 열었을 때,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는 ‘학교에서 이런 걸 왜 하느냐’, ‘사고당한 건데 진상 규명이 뭐 있느냐’라는 댓글이 달렸다. 심지어 같은 학교에 희생자가 있는 경우에도 혐오는 멈추지 않았다. 참사 이후 대학 캠퍼스에 추모할 공간도, 기억할 기회도 없었기 때문이다. 참사 이후 3년이 지났지만, 대학은 아직도 참사의 상흔을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못하고 있다.
청년과 대학생은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인 동시에 반복의 고리를 끊어내고 안전 사회를 건설할 책임이 있는 사회 구성원이다. 사회적 참사를 ‘사회적’이라 부르는 이유는 이것이 특정 개인의 부도덕만이 아닌, 구조적인 부정의가 중첩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참사가 끝나지 않는다. 함께 행동함으로써 생명을 경시하는 부정의한 구조를 바꾸어내야만 사회적 참사의 반복을 막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대학과 사회에서는 일회성 행사와 잠깐의 추모, 그마저도 대부분은 ‘불편한 이야기’라며 침묵으로 일관할 뿐이다. 청년이 침묵하면 청년을 죽게 만든 사회는 결코 바뀌지 않는다.
이태원 참사로 동료 시민을 잃은 청년들이, 희생자를 향한 혐오댓글에 불편함을 느끼는 대학생들이 참사를 기억하고 이야기해야 한다. 우리의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사회적 참사를 함께 기억하고 연대하며,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정치적 과제를 책임 있게 요구할 때, 비로소 진실과 정의가 도래할 것이다.
기본소득당 청년·대학생위원회 운영위원 남혜윤(basicincome_yout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