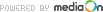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은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2026년 만 8세 이하까지 확대하여 임기 내 12세 이하까지 늘려 나가고, 저소득층 청년을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생애주기별로 촘촘하게 지원하는 기본사회 정책을 환영한다. 그러나 진정한 ‘기본사회’를 달성하기까지 갈 길은 멀다.
기본 중에 기본은 바로 기본소득이다. 특히 모든 아동·청소년에게 매월 3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기본소득과 조건없이 모든 청년이 미래를 안정적으로 설계할 기반이 되어줄 청년기본소득이 도입되어야 한다.
소득불평등이 출생불평등까지 이어지고 있다. 결혼 및 출산을 희망하는 청년에게는 돌봄을 분담해줄 ‘아이를 같이 키워주는 국가’가 필요하다. 영유아 집중 지원에 머무는 아동수당만으로는 지대한 양육비를 감당할 수 없다. 더욱이 학령기 아동의 막대한 교육비 지출을 보완하기 위해 아동의 생애 전 시기를 촘촘하게 보장하는 아동기본소득이 확대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동기본소득은 결혼과 출산을 통해 가족공동체를 꾸리고자 하는 청년에게 이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출산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교두보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아동·청소년의 권리로서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면,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생에 첫발을 내딛을 때부터 체화할 수 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모두가 주역이라고 하지만 AI의 확산으로 청년고용은 위축되고 있다. 지난 3년간 줄어든 청년층 일자리 21.1만개 가운데 20.8만개가 AI 고노출 업종이었다. 특히, AI는 경력이 적은 청년층의 업무를 상대적으로 쉽게 대체했다. 국가 주도의 인공지능 인재 양성은 중요한 과제이나, 국가 주도의 일자리가 언제나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일 수는 없다.
핵심은 AI 발전에 따른 이익을 공유해 소득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빅데이터는 모든 사람이 생산에 참여하는 사회공통자산이다. 임금 노동을 해야만 시민으로 인정하는 전통적 복지국가의 견해에서 벗어나, 빅데이터 생성에 기여하는 모두를 공유자 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 그렇게 조건 없이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기본소득은 시대의 변화에 가장 민감한 청년세대 삶의 안전망이 될 수 있다. 경기청년기본소득과 부산 청년 기본소득 프로젝트의 경우 청년기본소득은 구직이나 이직을 하려 할 때에도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여 다음 일자리를 찾거나 자기계발에 집중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여유를 마련해주었다.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의 혼란을 마무리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염원 속에서 출발했다.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모든 구성원의 존엄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본소득이다. 노키즈존으로 물리적으로마저 아동을 소외시키는 세계에 아동기본소득은 아동의 삶의 튼튼한 울타리가 되는 동시에 돌봄의 사회화 그 자체로 기능할 것이다.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은 실패할 수 있고 실패해도 된다고 말해주는 기댈 언덕이 되어준다. 개혁의 시계가 다시 흐르기 시작한 지금, 기본소득 있는 기본사회를 상상해 볼 때다.
기본소득당 청년·대학생위원회 운영위원 원지영(basicincome_yout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