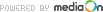청년 주거 안정을 목표로 추진되는 다양한 공공주택 정책들이 정작 필요한 이들에겐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학업을 위해 주거지가 절실한 대학생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청년 공공주택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공급·지원하는 저렴한 임대주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행복주택, 서울시의 청년안심주택이 대표적이다. 시세 대비 60~80% 수준으로, 낮은 보증금과 임대료가 장점이다.
대부분의 청년 전용 공공주택은 연령, 무주택 여부, 소득·자산 기준은 물론 주소지 요건까지 충족해야 한다. LH 홈페이지에 공시된 정보에 따르면 청년 매입주택의 입주 자격은 ▲무주택 요건 충족 ▲소득·자산 기준 충족 ▲미혼 청년(만 19~39세), 대학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취업준비생(졸업·중퇴 2년 이내 미취업자) 등이다.
이중 소득·자산 기준은 순위별로 나뉜다. △1순위는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면서 국민임대 자산 기준 충족 △3순위는 본인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면서 행복주택(청년) 자산 기준 충족 시 신청할 수 있다. 자산 요건은 △부동산·토지를 포함한 총자산 3억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2023년 기준)여야 한다.
그러나 대학생의 경우 부모의 소득과 자산이 합산되는 △2순위 자격 기준에 따라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대학생의 경우, 학업으로 인해 소득이 없거나 적어 부모로부터 완전한 경제적 독립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2023년 구인·구직 전문 플랫폼 '알바천국'이 20대 1천여 명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88%가 아직 경제적 독립을 하지 못했으며 부모님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답했다. 이중 대학생의 응답률은 97%에 달한다.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에 재학 중인 A 씨(27)는 “이제 자립을 하고 싶어 학교 근처 공공주택을 알아봤지만, 부모 자산과 제 자산을 합산한 조건으로 기준을 초과해 떨어졌다”며 “나중에는 자격 요건이 너무 복잡해 신청을 포기했고, 결국 비싼 월세를 내고 일반 자취방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청년 주택 관련 정책 정보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거복지사업만 해도 행복주택, 청년 전세임대정책 등 8가지 종류가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의 청년안심주택 등 각 지자체 공공주택까지 포함하면 종류와 운영 주체는 훨씬 다양하다. 각각 모집 공고와 일정이 달라 청년들은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다.
동국대학교 사회학과에 재학 중인 B 씨(22)는 “원룸은 부동산 앱으로 쉽게 찾을 수 있지만, 공공주택은 세세한 조건과 모집 공고를 일일이 찾아봐야 한다”며 “공공주택 정책이 다소 산발적으로 돼 있어 헷갈리고 정보를 놓치기 쉽다”고 전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주택임에도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점 또한 문제다. 서울시의 청년안심주택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일부 임대 사업자가 세입자 보증금을 지켜주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고,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설정하는 권리인 ‘근저당’을 보증금보다 큰 금액으로 잡아두는 경우가 많아서다. 세입자가 낸 보증금보다 은행이 먼저 가져갈 돈이 더 많아져 세입자에게 돈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지난 8월 22일, 서울 잠실센트럴파크 청년주택 세입자들은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안심주택의 부실 운영과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은 서울시의 늑장 대응을 비판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청년 공공주택 정책이 청년과 대학생 주거 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지자체나 정부 차원의 보완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아름 기자 (areumsecond@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