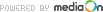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전 대통령의 바람과는 달리 분노한 시민들은 거리로 나왔다. 전국적으로 윤 대통령과 계엄 공모자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행렬이 밤낮없이 이어졌다.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되고 윤 전 대통령이 내란죄 관련 혐의로 구속되기까지는 시민의 역할이 컸다.
거리에는 청년들도 있었다. 80~90년대 한국의 민주화를 이끈 학생운동은 21세기에 접어들며 쇠퇴했다. 현재는 청년 세대의 '정치적 무관심'이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는 실정이다. 하지만 계엄 시국 속 청년들은 다시 시민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2030 여성이 들고 나온 '응원봉'은 탄핵 집회의 상징이 됐다.

역사를 잊지 않은 청년들
최지환(25) 씨는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접하자 국회의사당으로 향했다. 계엄군은 국회에 진입 중이었고 국회 정문은 경찰, 국회의원, 취재진, 시민으로 아수라장이었다. 굥교롭게도 최씨는 사건 며칠 전 부산과 광주에서 부마민주항쟁(1979)과 광주민중항쟁(1980) 당시 계엄사령부에서 자행한 폭력 행위와 언론 통제의 흔적을 보고 온 뒤였다.
그는 "진실이 진실이 아니게 되는 때가 온다면 진실을 알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과거 계엄령에 의해 벌어진 일을 알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계엄사령부를 설치하고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항목을 포함한 포고령을 발표했다.
최씨는 이후 매주 광화문에서 열린 탄핵 집회에 나갔다. 한겨울 아스팔트에 몇 시간씩 앉아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주위 사람들에게 윤 전 대통령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자리를 지켰다. 그는 "대통령의 권력은 대통령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국정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계엄을 선택한 것은 엄중히 다뤄야 할 일이다. 그것이 건강한 사회"라고 말했다.
최씨는 청년 세대가 주관과 개성을 존중하지 않고 '나만 잘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회에서 자라 정치적 의견 표출을 꺼리게 된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탄핵 집회에서 만난 청년들을 보며 희망을 얻었다. 그는 "2030 여성을 중심으로 청년들이 (계엄 선포가) 정의롭지 못한 일이라는 데 동감하고 있다"며 "우리(청년 세대)가 앞으로 사회를 이끌어도 괜찮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차별에 연대로 대응하다
시민의 목소리는 계엄 사태 규탄에서 멈추지 않았다.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농민, 하층 노동자,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가 주축으로 나서며 탄핵 집회는 차별과 혐오에 저항하는 공간이 됐다. 매주 토요일 열리는 광화문 집회에는 페미니스트 시국 발언대와 성소수자를 위한 무지개·트랜스존이 설치됐다. 발언대에 오른 시민들은 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 이동권 보장, 노동자 처우 개선, 공공의료 개선 등을 외치며 사회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사회 문제 해결을 향한 요구는 행동으로도 이어졌다. 2030 여성을 중심으로 한 시위대는 목소리를 필요로 하는 사회 곳곳으로 퍼져 나갔다. 전국농민회총연맹 트랙터 시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위, 그리고 동덕여대 대학 민주화 시위에도 많은 여성 청년이 참여해 힘을 보탰다.
'남태령 대첩'으로 알려진 전국농민회총연맹 트랙터 시위는 지난 12월 21일, 경찰이 전국농민회총연맹의 전봉준투쟁단 트랙터 행렬을 서초구 남태령 고개에서 막아서며 시작됐다. 전봉준투쟁단은 비상계엄 선포와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농업 4법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로 향하고 있었다. 해당 소식은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됐고 많은 시민들이 모여들어 경찰의 철수를 요구했다. 참여자의 다수는 2030 여성이었다. 현장에 있던 주혜빈(27) 씨는 "연대의 힘을 느낀 공간이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주씨가 남태령 고개에 도착한 22일 오전에는 자유 발언이 이뤄지고 있었다. 발언은 항상 정체성을 밝히며 시작됐다. 시민들은 정체성으로 인해 겪은 어려움을 공유하며 농민과도 연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씨는 "(시민들이) 농민의 목소리가 묵살되는 것을 보고 동지적 감정을 느낀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그는 "(남태령은) 어떤 정체성도 받아들여지고 연대를 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며 "연대를 위해 간 곳에서 되려 연대감을 느끼는, 이런 것이 청년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농성 시작 28시간 만인 22일 오후, 경찰이 철수하며 전봉준투쟁단 트랙터는 행진을 재개했다. 시민들은 '우리가 이겼다'는 구호를 연호하며 뒤를 따랐다.
일부 정치·언론계는 계엄 이후 여성 청년이 각종 집회의 주축이 된 현상에 물음표를 붙였다. 이에 주씨는 "2030 여성은 언제나 사회 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있던 사람들"이라며 "서로를 확인하고 공간(광화문, 남태령 등)이 마련되자 모일 수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덧붙여 "여성 청년의 수가 많을 뿐 성소수자, 농민, 노동자, 장애인까지 모두 (계엄 시국의) 주역"이라며 "그간 정치로부터 외면받던 사람들이 주인으로 나서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청년 정치인이 본 청년들은
김혜미 마포녹생단 공동운영위원장은 여성주의저널 '일다'에 여성 활동가들과 윤 대통령 탄핵 이후의 변화에 관한 연재를 기고했다. 지난 12월 26일에는 '남태령 대청' 참가자들과 시국집담회를 진행했다. 계엄 선포 이후 거리로 쏟아진 2030 여성의 목소리를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2030 여성이 왜 (정치적인 활동에) 이렇게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는지는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가장 큰 이유는 윤 대통령의 정치가 여성의 목소리를 지우고 페미니즘 정치와 운동의 역사성을 부정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여성 청년들이 새로운 정치 참여 방식을 선택한 것 같다"고 했다. 그는 "2010년대에 들어 여성들은 사회 운동도 해보고 정당도 만들어 보고 믿을 만한 정치인을 키워 보기도 했다. 하지만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한 체제를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달았다"며 이번에는 자신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거리로 나가 보여주자고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덧붙여 "청년드링 지금처럼 더 넓은 방향으로 연대하는 데 거침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계엄 시국) 이후에도 함께 필요한 정치를 요구하는 당당한 시민으로서의 삶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안재현 기자(screamsoloo@gmail.com)
*본 기사는 대학알리 지면 VOL.1 <알리가 본 세상>에 실린 기사입니다.